 지난주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소설가 김주영 씨는 “문학이라는 것은 늘 가난한 주변부의 것인데, 내가 훈장을 받게 된 것이 문학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앞으로 문학 활동을 더욱 열정적으로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
그 어머니는 올봄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했다. 아들을 뛰어난 소설을 쓴 작가로 잘 길러낸 데 대한 답례였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아들 김주영(68) 씨가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2일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이사장실에서 만난 김 씨는 “상에 둔감한 편인데 올해는 어머니가 받으신 지 얼마 안 돼 내가 받게 돼 좀 얼떨떨한 심정”이라며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2005년부터 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소감을 물었더니 “(시상식 때) 가수 보아를 지근거리에서 본 게 소득”이라고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그러더니 이내 숙연해졌다.
“수훈자를 보니 추서한 경우가 꽤 됩디다. 훈장은 그렇게 생을 마감한 분이 받는 건데 이승에서 숨쉬는 사람이 끼어 있구나, 생각했어요. 내 생애가, 하루의 시간으로 치자면, 노을의 지경에 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 촬영·편집 :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감자와 옥수수만 지겹도록 먹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지금도 양식에 손이 안 간다는 김 씨(양식에는 대개 감자와 옥수수가 곁들여진다). 지금껏 몸뚱이에서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 땟국은 그러나 그를 작가로 키우는 거름이 됐다. 시외버스 표 하나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하루라도 외지로 놀러 나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경북 청송의 벽지 소년은 오로지 고향 바깥을 그려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의 말대로 “작은 마을에서 백 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상상력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두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던 상처도 컸다. “천성적인 소질도 문학 쪽으로 진행되고 있었겠지만 외로움에 단련돼야 했던 환경도 작가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을 것”이라고 김 씨는 돌아본다.
유명한 ‘객주’를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을 때가 나이 마흔이다. 조선 후기 상업사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고심한 끝에 아예 짐을 싸 들고 전국 장터를 떠돌기를 5년여. 시골 여인숙 골방에서 원고를 쓰고 우체국에 가서 원고를 부쳤던, 그야말로 길 위에서 쓰인 작품이다.
“천재성을 발휘했다기보다 근면성으로 문학을 한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그랬어요.” 가난에 찌들었던 그에게는 세상에 대한 격렬한 고민보다 밥벌이가 더 절박했다. 해질 때 들어갈 집이 있어야 했고, 추위를 막아 줄 털옷이 있어야 했다. “세상을 살얼음 밟듯이 조심스럽게 살았고, 그래서 돌출행동이나 모험보다 무진장한 노력이 절실하게 다가왔다”고 김 씨는 말한다. 조선 후기 유랑 보부상들의 삶과 애환을 생생하게 그려 낸 이 소설을 쓰면서 김 씨는 ‘문학이, 뼈대가 억센 남자의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확신했다.
‘객주’와 더불어 그 자신 중요하게 여기는 작품이 ‘야정’이다. 1989년 ‘절필 선언’을 하고 1년여 칩거했다가 다시 쓴 소설이다. “동아일보 문학 담당 기자가 작품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수차례 청했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야정’을 쓰게 됐습니다. 그 기자가 지금은 문화부장이더군요.”(웃음)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찾아 쓰는 숨 가쁜 삶에 지쳐서 ‘절필’에까지 이르렀지만, 결국 자신은 작가로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김 씨. 일흔을 앞둔 나이에도 “내가 쌓아 놓은 게 없어서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이다.
1989년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설립 때부터 상임이사로 일했고 2005년 재단 이사장이 된 김 씨는 그간 재단을 통해 일본 러시아 페루 등 세계 각국과 문학 교류를 추진해 왔다. 특히 1992년부터 10년 동안 한독 문학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올 초 ‘한중 작가회의’를 시작으로 중국과 문학 다리 놓기에 나섰다. 문학과문화를사랑하는모임, 명천이문구기념사업회 등 여러 문학단체의 대표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향 청송에 ‘객주문학테마타운’을 건립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객주문학테마타운’은 청송군이 ‘객주’를 주제로 2010년까지 객주문학관과 테마장터, 야외문학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 “더 많은 사람이, 문학을 다양하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김 씨는 소망을 밝혔다.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생전에 그러셨어요. 어깨에 힘을 빼라고.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온몸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쓰라고요. 그래야 상상력도 잘 풀린다고요.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소설 쓰지 않는 때에도 손을 놀리지 말라고요. 뭐라도 계속 끼적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 작가는 본보에 ‘작가 김주영의 그림 읽기’를 싣는 한편 월간 ‘현대문학’에 소설 ‘붉은 단추’를 연재하고 있다.
“소설은 오랜만에 쓰는 건데, 어느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독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진도가 안 나가서 고민입니다.”
그 진지한 얼굴은 젊은 작가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 김주영 | |
| △1939년 경북 청송 출생 △1962년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업 △1971년 단편 ‘휴면기’로 ‘월간문학’ 신인문학상 수상 등단 △창작집 ‘도둑견습’ ‘겨울새’, 장편 ‘객주’ ‘천둥소리’ ‘활빈도’ ‘야정’ ‘화척’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홍어’ ‘멸치’ 등 △한국소설문학상(1983년) 유주현문학상(1984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93년) 이산문학상(1996년) 대산문학상(1998년) 등 수상, 은관문화훈장(2007년) 수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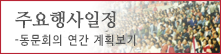
![제358호 [2025년 12월]](https://caual.com/files/thumbnails/151/068/220x311.crop.jpg?20251208134234)
![제357호 [2025년 10월]](https://caual.com/files/thumbnails/594/067/220x311.crop.jpg?20251013121946)
![제356호 [2025년 7월]](https://caual.com/files/thumbnails/897/066/220x311.crop.jpg?20250808122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