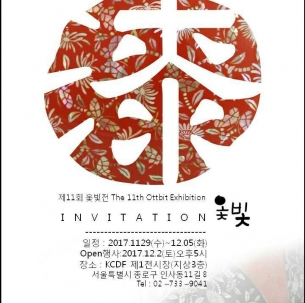<산수화의 매직, 이동시점>
지난 여름 내내 <긴 봄>이란 그림을 붙들고 씨름했다. 세로 75cm에 가로 30m의 대작이다. 남도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에서 마음먹고 추진하고 있는 2017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이다. 남도의 여러 가지 나무로 울울한 풍경 안에 스며있는 어릴 적 봄을 그렸다. 황량한 풍경에 스며있는 따뜻한 인정을 그린 것이다.
<긴 봄>은 제목처럼 옆으로 매우 길다. 그림에 등장하는 산은 대략 열두 개쯤 된다. 남도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산들이다. 영암 월출산이나 목포 갓바위처럼 알려진 산도 있지만 나머지 산들은 남도 어디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다. 여러 지역의 산들을 말 잇기 놀이처럼 옆으로 이어 붙여 하나의 풍경으로 구성하였다. 시방식도 이동 시점을 나름 극대화한 역원근법을 적용하여 멀리 있는 것을 크게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작게 그렸다. 화면의 위가 근경이고 아래가 원경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풍경도 그림 안에서 가능한 것은 이동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동 시점은 다시점이라고도 한다. 하나의 그림에 화가의 시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한다. 시점을 이동하면서 그려나가기에 상하 좌우로 긴 그림이 가능하다. 한국화에서 위로 긴 그림이나 옆으로 긴 그림이 유독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중국의 화가 장대천이 그린 <장강만리도>는 가로 길이만 따져도 수십 m에 이르는 대작이다. 양자강의 발원지에서부터 포구까지 그림 것이다. 마치 헬기를 타고 가면서 그린 느낌이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풍경을 서구의 고정시점으로 한 화면에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예술에서 작품의 주제가 새로운 것은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서 얻어들은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살아가면서 직접 느끼고 깨달았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동 시점도 동양의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삶의 철학에서 탄생했다. 자연과 나의 거리를 없애고 그 안에서 순응하며 살고자했던 태도가 이동시점이란 독특한 그림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수렴된 것이다. 천인합일의 동양 철학이 만들어낸 형식이다. 동양화의 시점은 이동하기에 화가의 시점이 그림 안에서 움직인다. 여러 개의 시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서양의 사실적인 풍경은 고정시점이다. 한 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방식이다. 자연과 내가 따로 존재한다. 서양의 사실적인 그림에선 화가의 위치가 화면 밖에 있다. 마치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것과 같다.
이동시점이 만들어낸 잘 알려진 그림 형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병풍과 합죽선이 있다. 병풍은 각각의 그림들이 독립되어 있으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그림의 구도를 정할 때 각각의 폭들이 서로 다르면서 옆 화면과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한 폭으로 된 일지 병풍도 그림의 폭과 폭 사이에서 형태가 애매하게 설정되면 안 된다. 떨어지게 그리던지 지나가게 그려야 한다. 병풍은 감상할 때 펴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두 펼치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 옳은 감상 방식이다. 그래야 각 화면이 독립적으로 살아나고, 구겨진 곡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산보하듯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합죽선은 부채의 살이 그림의 수직축이다. 수직축은 부채의 모양을 따라 좌우로 둥글게 펼쳐지며 시점도 그 모양을 따라 이동한다. 이 형태에 맞춰 풍경을 그리면 풍경의 지평선이나 해안선이 둥글게 휜다.
한 때 우리 화단에서 실경산수의 열풍이 불어 너도나도 밖으로 나가 현장에서 산수화를 그리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 때 서양의 풍경화처럼 고정시점으로 그리는 것이 새로운 실험처럼 받아들여졌다. 유행이 한풀 꺾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눈에 이 부분이 불편하고 오히려 재미가 없어졌다. 사실적인 묘사를 빼고 나면 새로울 것도 없었다. 우리 그림에 내재한 이동시점을 버릴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더 실험적일 것 같았다. 이동시점을 아예 더 강하게 적용시켜보자는 생각이 들어 멀리 있는 것을 크게 그리고 가까운 것을 작게 그려보았다. 마치 땅이 일어서는 느낌이었다. 그 때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대지의 꿈틀거리는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기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 이 때 이동시점이야말로 산수화에서 작가의 상상을 다양하게 구성하게 하는 묘한 매력을 지닌 시방식이자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일상적 풍경을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새롭게 그리게 만드는 뭔가가 숨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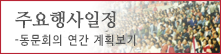


![제348호 [2024년 03월]](https://www.caual.com/files/thumbnails/211/061/220x311.crop.jpg?20240322162821)
![제347호 [2024년 01월]](https://www.caual.com/files/thumbnails/724/060/220x311.crop.jpg?20240129174329)
![제346호 [2023년 11월]](https://www.caual.com/files/thumbnails/294/060/220x311.crop.jpg?20231129104343)